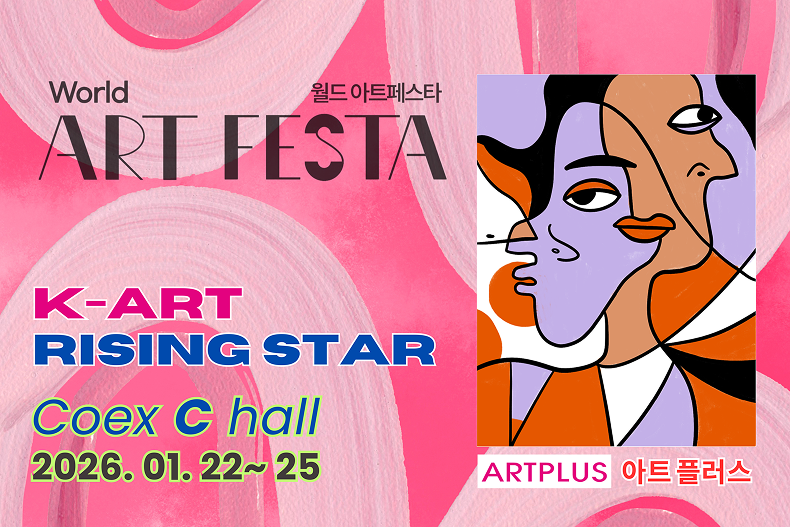문화저널코리아 오형석 기자 | 현대 사회의 단절과 상처를 ‘실과 자투리천’이라는 소박한 소재로 꿰매며 치유와 연결의 예술을 선보여 온 송미리내 작가가 최근 KFN 라디오 *‘오유경의 뮤직 갤러리’*에 출연해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과 인생 여정을 풀어놓았다. 한 여성 예술가의 고난과 집념, 그리고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문화저널코리아 오형석 기자 | 현대 사회의 단절과 상처를 ‘실과 자투리천’이라는 소박한 소재로 꿰매며 치유와 연결의 예술을 선보여 온 송미리내 작가가 최근 KFN 라디오 *‘오유경의 뮤직 갤러리’*에 출연해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과 인생 여정을 풀어놓았다. 한 여성 예술가의 고난과 집념, 그리고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송미리내는 1982년생으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부모님 곁에서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천과 실, 그리고 재봉틀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은 예술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DNA 속에 새겨진 실과 자투리천은 결국 제 삶의 숙명이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부모님의 삶이 곧 자신의 창작 뿌리가 되었음을 고백했다.
IMF 외환위기로 가정 형편이 기울던 시기, 그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몰렸지만 아르바이트로 모은 20만 원을 들고 미술학원 문을 두드렸다.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 순간은 ‘예술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돌보며 삶과 죽음의 순환을 마주한 경험은 그에게 예술적 사유의 토대를 남겼다.

송미리내의 작품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다. 그의 손끝에서 실은 가족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끈으로 재탄생한다. 2013년, 그는 실을 본격적으로 작품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하루 16시간씩 5개월을 꼬박 매달려 작업하는 치열한 과정은 결국 건강을 잃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작품 속에 독보적인 긴장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2020년,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무작정 산에 오른 그는 명상과 호흡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작업이 자연의 리듬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순환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송 작가의 대표작은 ‘Connecting Link’(2015), ‘Synapse’(2021), ‘소생하다’(2022) 등이다. 이 작품들은 실을 통해 관계와 신경망, 생명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풀어낸다. 단절을 꿰매는 바느질은 치유의 과정이자, 관객과 사회를 향한 열린 대화이다.
그의 작업은 점차 확장되었다. ‘텍스트 드로잉’에서는 관객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아내며 감정과 기억을 시각화했고, ‘커뮤니티 아트’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적 예술을 실험했다. 소마미술관 전시 *〈공원의 낮과 밤 – 만들어진 풍경, 재생되는 자연〉*에서 선보인 ‘바람이 통하는 시아: 붉은 실의 방’은 올림픽공원의 생태적 변화를 설치미술로 해석한 작품으로, 사회적 메시지와 심미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송미리내는 2023년 코리아 아티스트 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으로 예술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4년에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소마미술관 17기 등록작가 10인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공인받았다. 지난해 개인전 *〈디스토피아의 회복으로부터〉*에서는 자투리천을 업사이클링하여 환경 문제와 치유, 순환적 연결성을 동시에 탐구했고, ESG 공동체 연대라는 시대적 화두를 예술로 풀어냈다.
그는 단순히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와 다문화 가정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한다. 예술이 개인의 치유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작업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명상(冥想)을 중요한 축으로 언급했다. “명상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작업에서도, 삶에서도 명상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죠.” 그는 실과 천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듯,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수행하듯 작품을 이어간다.
예술평단은 그를 ‘한국의 시오타 치하루’라 부른다. 그러나 송미리내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 언어 ‘코리아 이모션’을 구축하며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고립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미리내의 작품은 이 균열을 ‘실과 천’이라는 일상적 재료로 직조하며,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진다. 관객은 그의 작품 앞에서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함께 꿰매고 이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송미리내는 말한다. “바느질은 제게 수행이자 생명력입니다.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회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실과 자투리천으로 꿰매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의 예술은 시대의 상처를 감싸며 공동체적 울림을 확산시키고 있다. 치유와 연결의 화가 송미리내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